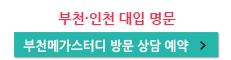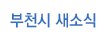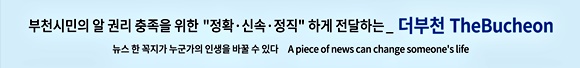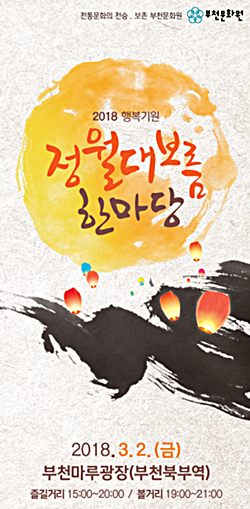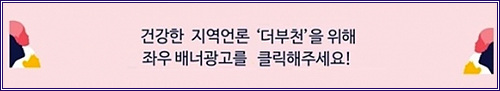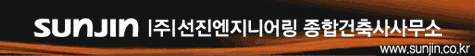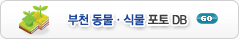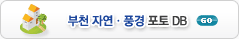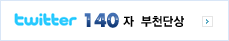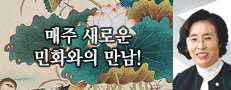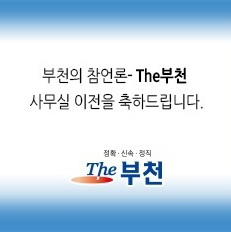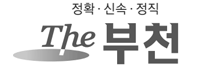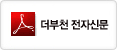이번 행사는 부천문화원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전통놀이, 체험, 공연으로 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돼 정월대보름 풍습의 계승 발전을 통해 민속의례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 시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해 정주의식을 함양하자는 취지로 열린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LED쥐불놀이ㆍ윷놀이ㆍ투호ㆍ가훈쓰기ㆍ소원쓰기ㆍ부럼깨기ㆍ석궁쏘기ㆍ전통음식ㆍ전통 혼례복 체험 등 전통놀이가 열린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길놀이, 민요, 풍물놀이, 달집 태우기, 강강술래가 펼쳐진다.
특히 달집 태우기는 부천마루광장에서 달집을 태울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만큼 모형으로 달집을 제작하고, 조명 등을 이용한 임팩트 효과를 살려 달집을 태우는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LED 전구를 활용한 쥐불놀이를 진행한다.
강강술래는 공연단(소리팀)의 강강술래 노래에 맞춰 시연단이 강강술래 시연을 펼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강강술래를 진행해 대동제 성격의 화합과 친목 도모의 장을 펼친다.
부천문화원이 주최하는 ‘2017 행복기원 정월 대보름 한마당’ 행사는 부천문화원 홈페이지(www.bucheonculture.or.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문의는 부천문화원(☎032-651-3739)으로 하면 된다.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은 우리나라 세시풍속에서 비중이 크고 뜻이 깊은 날이기 때문에 ‘대보름’이라고 특별히 일컫는다.
이날을 ‘상원(上元)’이라고도 하는데, 중원(中元, 7월15일), 하원(下元, 10월15일)과 연관해서 부르는 한자어다. 또 이날을 ‘오기일(烏忌日)’ 또는 ‘달도(怛忉)’라고도 부른다.
보름의 유래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기이(紀異)」 사금갑조(射琴匣條)에 나오며, 까마귀가 소지왕을 인도해 위급을 면하게 했고, 15일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하여 찰밥으로 제사를 지냈고 지금도 찰밥을 먹는다.
‘달도(怛忉)’라는 말은 오기일과 첫 번째 돼지날ㆍ쥐날ㆍ말날들의 속말로 백사를 삼가는 날로 돼 있는데, 세수(歲首, 1월1일)ㆍ첫 번째 쥐날ㆍ말날ㆍ돼지날ㆍ대보름ㆍ2월1일에는 마음이 들떠서 좋아하지만 말고, 삼가고 조심성 있는 마음가짐을 일깨우던 의미이다.
▲의례=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 공동의 의례들이 행해진다. 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지연적인 화합을 다지는 동제(洞祭)를 비롯해 별신굿 등 간단한 굿을 하기도 했다.
또 정초부터 대보름 전후에 동네 농악대가 집집을 돌며 즐겁게 놀고 축원해 주는 ‘지신밟기’, 마을의 상징인 농기(農旗)와 농악대들이 모여서 서열에 따라 인사를 하는 ‘기세배(旗歲拜)’, 14일 밤에 붕어나 자라를 사서 강에 놓아 주고 소지(燒紙) 축원을 올리는 ‘방생(放生)’, 논두렁의 잡초와 병충을 없애고 재가 거름도 되고 논두렁이 여물어지고 농사가 잘된다는 의미를 담은 ‘쥐불(놀이)’ 등을 했다.
▲속신= 대보름 전날 짚을 묶어서 기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벼ㆍ기장ㆍ피ㆍ조의 이삭을 넣어서 싸고 목화도 같이 장대 끝에 매달아 집 곁에 세우고 고정시켜 풍년을 기원하는 ‘볏가리(禾積)’, 정월 열나흗날이나 대보름에 감ㆍ대추ㆍ배 등 과일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두는 풍습,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잘 사는 집 대문 안의 흙을 몰래 가져와서 자기 집 부뚜막에 바르는 ‘복토 훔치기’, 보름 전날 밤 닭 울기를 기다려서 앞을 다투어 정화수를 길어 오는데 맨 먼저 정화수를 긷는 사람이 그해 농사를 제일 잘 짓는다는 ‘용알뜨기’도 행해졌다.
또 정월 대보름날 밤에 다리(橋)를 밟으면 다리(脚)가 튼튼해진다고 했고, 정월 열나흗날과 대보름에는 모든 행동을 아홉 차례씩 한다는 관습이 있어 ‘나무 아홉 짐’, ‘새끼 아홉 발’을 꼬면 큰 부자가 된다고 했고, 부인은 빨래 아홉 가지, 학생은 글 아홉 번, 글씨 아홉 줄을 쓰라고 했는데 부지런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월 대보름 내에는 복(福)을 더는 일이라고 생각 가능한 한 곡식을 밖에 내지 않았는데, 특히 쌀 반출을 금했고, 돈이 필요해도 대보름 전에는 내다 파는 일은 삼가는 풍습도 있었다.
정월 대보름에는 기풍과 관련된 점복이 많이 행해져 대보름날 초저녁에 높은 곳에 올라서 달맞이를 하고 점을 쳤는데, 달빛이 붉으면 가물 징조, 희면 장마가 길 징조, 달의 사방이 짙으면 풍년, 옅으면 흉년이 들 징조로 여겼다.
또 보름달을 보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고, 짚이나 솔잎, 나무들을 모아서 달집을 만들고 보름달이 뜨기를 기다려서 불을 지르고 환성을 질러 달집 속에 대나무들을 넣어서 터지는 폭음으로 마을의 악귀를 쫓기도 했으며, 달집이 탈 때 고루 잘 타오르면 풍년, 다 타고 넘어질 때 그 방향과 모습으로 흉풍을 점치기도 했다.
대보름날 밤 사발에 재와 그 위에 여러 가지 곡식의 씨를 놓고 지붕 위에 올려놓은 뒤 다음날 아침 날아간 곡식은 흉작, 남은 곡식은 풍작이 된다고 점을 쳤고, 대보름 전날 밤에는 하루 세끼를 먹는 소에게 한 번 더 주고 오곡밥도 쇠죽에 섞어서 준 뒤 소가 쌀을 먼저 먹으면 쌀 풍년, 콩을 먼저 먹으면 목화 풍년 등으로 점을 쳤으며, 대보름날에는 외양간 앞에 상을 차리고 일년 내내 소가 일 잘하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대보름날 새벽에 첫닭 우는 횟수를 세어서 횟수가 적으면 흉년, 열 번 이상을 울면 풍년이 된다고 했다.
개인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액막이 풍습도 행해졌다. 짚인형을 만들어 속에 돈이나 쌀을 넣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제웅을 대보름 전날 초저녁에 길에 버리면 주워가는 사람에게 액이 옮아간다는 ‘제웅치기’를 했는데, 제웅을 한자로 ‘처용(處容)’이라고 적고 있다.
정초부터 날리던 연을 대보름날에는 날려 보내는데, 이때 연에 ‘송액(送厄)’ 또는 ‘송액영복(送厄迎福)’ 등의 글귀를 써서 하늘 높이 띄우고 연줄을 끊으면 연은 한없이 날아가 버리고 그 연의 주인이 지닌 액은 다 사라진다고 한다고 ‘액막이연’도 날렸다.
대보름날 아침에 사람을 보면 급히 이름을 불러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라고 하면 그해에는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더위팔기’를 했고, 대보름날 개에게 밥을 주면 여름에 파리가 끼고 마르기 때문에 대보름날은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 ‘개보름 쇠기’는 속담에 굶는다는 의미의 ‘개 보름쇠듯 한다’는 말도 있다..
그해 운수가 나쁜 사람은 짚으로 섬이나 작은 오쟁이를 만들고, 안에 돌이나 흙을 넣되 더러는 돈을 넣기도 하는데, 이것을 열나흗날 저녁에 남모르게 개천에 디딤돌로 놓는데, 이 일을 다리(橋) 공드린다고 하며, 다음날 아이들이 오쟁이를 발견하면 돈을 가져가기도 하는 것을 ‘월천공덕(越川功德)’이라고 불렀다..
구충(驅蟲)을 위한 풍속도 행해져 대보름날 새벽에 마당에 짚불을 놓아 여름철의 모기 성화를 미리 쫓는 ‘모깃불’을 지폈고, 모깃불에 참대나 아주까릿대를 넣어서 마디가 튀는 소리로 잡귀를 쫓는 풍습도 있었다.
▲절식= 정월 대보름의 시절음식으로는 대보름날 아침에 데우지 않고 찬 술을 한 잔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일년 내내 좋은 소식만을 들을 수 있다는 ‘귀밝이술(이명주 耳明酒), 대보름날 아침에 날밤ㆍ호두ㆍ은행ㆍ무 등을 깨물면 일년 열두 달 무사태평하고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는 ’이굳히기(固齒之方)’이라는 ‘부럼깨기’ 풍속이 있다.
정월 대보름날을 전후해서 찰밥과 약밥을 먹는 풍속이 있다. 찹쌀을 쪄서 대추ㆍ밤ㆍ기름ㆍ꿀ㆍ간장을 섞어서 함께 찌고 잣을 박은 ‘약밥(藥飯)’과 찰밥(糯飯)을 먹고, 오곡으로 잡곡밥(오곡밥)을 지어 먹었으며, 14일 저녁을 일찍 많이 먹고 15일 아침도 일찍 먹는데, 일년 내내 부지런하라는 뜻을 갖고 있다.
어린이가 봄을 타서 야위면 대보름날 백 집의 밥을 빌어다가 절구를 타고 개와 마주 앉아서 개에게 한 숟갈 먹이고 자기도 먹으면 다시는 그런 병이 없어진다고 해서 ‘백가반(百家飯)’이라고 했고, 조리밥 또는 세성받이밥이라고 해서 열나흗날 저녁, 대보름날 아침에 아이들이 체나 조리로 보름밥을 얻으러 다녔는데 특히 더위를 안 먹고 몸에 좋다고 여겼다.
정월 대보름에는 묵은나물과 복쌈을 먹는 풍속도 있다. 호박고지ㆍ무고지ㆍ가지나물ㆍ버섯ㆍ고사리 등을 여름에 말려 두었다가 대보름날 또는 정월 열나흗날에 나물로 무쳐 먹으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여겼으며, 김이나 취로 밥을 싸서 먹는 것을 ‘복쌈’이라고 부른다.
▲놀이= ‘줄다리기’를 비롯해 줄다리기의 전초전인 ‘고싸움놀이’, ‘차전놀이’(동채싸움), ‘놋다리밟기’, ‘사자춤’, 조선시대 각급 관원들의 가장 행렬과 악대가 호화로운 모습을 본 딴 ‘관원놀음’(들놀음, 오광대) 등이 있다.
▲금기= 대보름날 금기로 여겼던 것은 대부분 농경사회일 때 적용했던 풍속이다. 김치, 백김치, 깍두기를 먹지 않았고, 음식을 조리할 때에도 고춧가루를 넣지 않았으며, 찬물과 숭늉을 마시지 않은 대신에 챗국이나 맑은 콩나물국을 마셨다.
또 ‘비린 것을 먹지 말라’는 금기가 있어 생선과 같은 비린 것을 먹지 않았고, 개에게 밥을 주지 않았으며, 칼질을 하는 것을 금기시해 14일 밤에 미리 음식 재료를 손질해 두었으며, 대보름날 오전에는 마당을 쓸지 않았는데 오전에 마당을 쓸면 한 해 복이 나간다고 여겼다.
| AD |
쓰레기는 집 밖으로 버리지 않았고, 빗질을 하지 않았고 머리도 감지 않았으며, 빨래도 하지 않았다.
한편, 달집태우기는 정월대보름달이 떠오를 때에 달집에 불을 지펴 노는 풍습으로, 달집이 훨훨 타야만 마을이 태평하고 풍년이 든다고 했으며, 달집을 태우는 불이 타오르며 피오르는 연기가 보름달을 가리면 좋다고 해서 솔잎이 많은 소나무를 높이 쌓아 달집을 높이 만들기도 헸으며, 그해 액운이 든 사람의 저고리 동정이나 동정에 생년월일시를 쓴 종이를 붙여 함께 태우기도 한다.
강강술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로, 노래와 춤이 하나로 어우러진 부녀자들의 집단놀이로 주로 전라남도 해안지방에서 정월대보름과 8월 한가위를 전후해 달밤에 행해졌다.